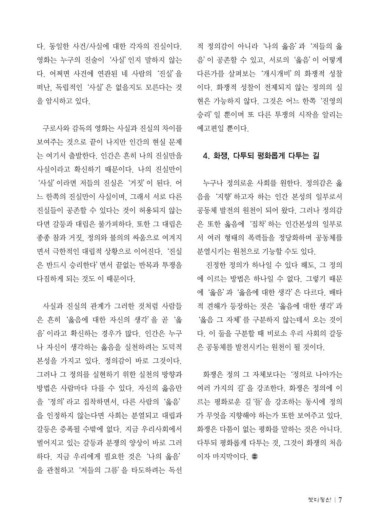Page 9 - 붓다동산747호
P. 9
다. 동일한 사건/사실에 대한 각자의 진실이다. 적 정의감이 아니라‘나의 옳음’과‘저들의 옳
영화는 누구의 진술이‘사실’인지 말하지 않는 음’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의‘옳음’이 어떻게
다. 어쩌면 사건에 연관된 네 사람의‘진실’을 다른가를 살펴보는‘개시개비’의 화쟁적 성찰
떠난, 독립적인‘사실’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다. 화쟁적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 정의의 실
을 암시하고 있다. 현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어느 한쪽‘진영의
승리’일 뿐이며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구로사와 감독의 영화는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예고편일 뿐이다.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인간의 현실 문제
는 여기서 출발한다. 인간은 흔히 나의 진실만을 4. 화쟁, 다투되 평화롭게 다투는 길
사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의 진실만이
‘사실’이라면 저들의 진실은‘거짓’이 된다. 어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정의감은 옳
느 한쪽의 진실만이 사실이며, 그래서 서로 다른 음을‘지향’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진실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공동체 발전의 원천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정의감
다면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다. 또한 그 대립은 은 또한 옳음에‘집착’하는 인간본성의 일부로
종종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여겨지 서 여러 형태의 폭력들을 정당화하며 공동체를
면서 극한적인 대립적 상황으로 이어진다.‘진실 분열시키는 원천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은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끝없는 반목과 투쟁을 진정한 정의가 하나일 수 있다 해도, 그 정의
다짐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
에‘옳음’과‘옳음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배타
사실과 진실의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 적 견해가 등장하는 것은‘옳음에 대한 생각’과
은 흔히‘옳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곧‘옳 ‘옳음 그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데서 오는 것이
음’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누구 다. 이 둘을 구분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갈등
나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을 실천하려는 도덕적 은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원천이 될 것이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정의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방향과 화쟁은 정의 그 자체보다는‘정의로 나아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옳음만 여러 가지의 길’을 강조한다. 화쟁은 정의에 이
을‘정의’라고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의‘옳음’ 르는 평화로운 길‘들’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의
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분열되고 대립과 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또한 보여주고 있다.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화쟁은 다툼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양상이 바로 그러 다투되 평화롭게 다투는 것, 그것이 화쟁의 처음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나의 옳음’ 이자 마지막이다. . 동산불교대학·대학원
DongSan Buddhist Academy
을 관철하고‘저들의 그름’을 타도하려는 독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