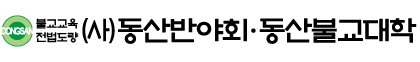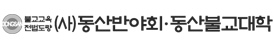반야사상의 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15 15:42 조회5,434회 댓글0건본문
반야사상의 이해

김형준 교수
반야를 완성하지 못하는 자가 취득되지 않는 것을 취해 일체지성을 향해 나아가는 일은 없습니다.<팔천송반야바라밀다경>
1. 반야란 무엇인가?
반야(般若)란 ‘직관적 ․ 총체적인 특색을 지닌 지혜’를 뜻하는 말로, 대상을 분석하는 지(知, vijñāna)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은 아마도 범어 프라쥬냐(prajñā)의 속어형인 판냐(paññā)의 음사어라고 여겨진다. 이는 불교 전체를 일관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초기불교에 있어서는 무상 ․ 고 ․ 무아라는 삼법인(三法印)으로써 일체 현상[法]을 관찰하는 것이 반야에 해당한다. 반야경류의 대승경전에서는 실체가 비어 있다는 공관(空觀)이 반야지(般若智)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이란 무아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기에 대승의 반야 역시 삼법인에 기반한 사유작용을 가리키며, 나아가 괴로움이 완전히 그친 이상세계[涅槃寂靜]에 대한 믿음과 중생들에 대한 무한한 연민의 마음이 합해져 발휘되는 마음작용을 바로 대승의 반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은 범어 Prajñā-Pāramitā에 대한 역어이다. 범어 본래의 의미는 ‘지혜의 완성’을 뜻한다. 여기에서 바라밀(波羅蜜)에 해당하는 범어 pāramitā의 구조를 보면, pāramī(parama에서 파생)+tā(상태를 나타내는 어미)의 형태이다.
이 말이 ‘도(度)’ 혹은 ‘도피안(度彼岸)’을 의미하게 된 것은 Pāramitā를 pāran(彼岸)+i(‘도달된’을 의미하는 ita에서 -ta를 생략)+tā의 합성으로 분석한 데서 유래한다. 물론 이와 같은 어원분석은 다분히 탈문법적인 것으로, 그 목적은 교의적 의의를 도출해 내려는 데에 있다.
반야는 이미 초기불교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쓰이던 용어로, 통상 ‘지혜’로 번역된다. 하지만, 대승의 입장에 서면 지혜 정도로는 실상 그 뜻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지는 못한다. 대승에서 쓰이는 반야는 그 이전의 반야와는 의도하는 바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곧 소승에서의 반야가 불도수행자의 명철한 도력(道力)을 상징한다면, 대승의 반야란 범부가 알아 챈 ‘실존에 대한 자각’이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한 모습일 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대승에서 언급되는 반야란 삶에 허우적대던 뭇 중생들이 비로소 자신의 처한 상황을 눈치 채기 시작한데서 드러나는 마음의 빛이다. 그래서인지 팔천송반야와 같은 초기의 반야경전에서 드러나는 반야는 매우 정서적이고도 역동적인 의식의 흐름 그 자체이다.
이처럼 대승의 반야란 모순을 ‘눈치챔[悟]’을 전제로 일어나는 ‘의식의 빛남’이다. 곧, 나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으로서의 오온의 부조화가 일으키는 모순[苦]에 대해 되돌아봄으로써 일으키고, 뉘우침으로써 일으키며, 나를 둘러싼 모든 것(一切法)들에 대해 연민함으로써 일으키는 의식의 빛이 바로 반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승의 반야는 미혹한 범부의 특권이기도 한 것이다.
2. 반야경(般若經, Prajñāpāramitā-sūtra)
반야경은 이른바 대승(大乘, Mahāyāna)를 최초로 선언한 선구적 경전이다. 하지만, 반야경은 한 가지의 경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경전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표현이다. 한역된 경전 가운데 ‘반야’를 제목으로 삼는 경전만도 42종류에 달하며, 최초의 출현에서부터 약 600여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반야경전은 남인도에서 형성되어 점차 북인도로 전파되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작은 게송에서 출발하여 2만5천송, 12만송에 이르는 반야경전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이를 요약한 반야심경이 출현하게 된다. 팔천송반야경과 같은 소품류는 초기반야경전의 이 같은 흐름 가운데에서도 이른 시기에 속한다.
초기 반야경의 성립 시기는 대략 기원전후 1세기 무렵이며, 성립의 주체는 기존의 부파불교와 대립하던 법사들(dhrma-bhanaka)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아비달마불교의 격식과 번쇄함을 극복하고, 나아가 불도의 희망을 잃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행복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로 가득차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용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솔직히 평범한 이들에게 있어서 초기·부파불교의 가르침은 그 이론만큼 절실하게 와 닿지는 않는다. 곧, 내용 그 자체야 어려울 것이 없겠지만, 실천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대개의 교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벗어난 특별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교리의 주제는 여읨[離]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깨달음을 완성한 이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겠노라’며 후유불수(後有不受)를 선언한다. 어느 한 구석 삶의 티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구제받지 못한 중생에 대한 배려는 뚜렷하지가 않다. 바라문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만인의 구원을 선포한 고오타마의 불교가 스스로의 틀 속에 갇혀 버렸다는 인상이다.
초기의 반야경은 이 같은 정황에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반야사상의 출현은 불교사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매우 새롭고 크다. 대승불교의 출현에 앞서, 부파불교는 더 이상 붓다의 복된 가르침을 전하는 행복의 나침반은 아니었다. 곧, 그들이 대중을 안주에 두지 않고 자신들만의 깨달음을 향해 완고히 나아가고 있을 때, 이들의 이기적인 모순을 과감히 비판하면서 원초의 붓다의 구원을 보여주고자 했던 초기대승불교는 스스로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범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제시였다고나 할 것이다.
반야경에 있어서는 초기·부파불교에서 정립된 대부분의 불도수행의 이론들은 그 한계를 선언당하기에 이른다. 한마디로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초기·부파불교의 이상이 고제[苦諦]로 표현되는 이 현실의 삶을 여의고 홀로 가는 수행완성자의 길이었다면, 초기반야사상에서의 이상은 이 고통의 현실을 행복의 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 곧 ‘이 삶을 사랑하고’ ‘삶을 완성하고’ ‘삶의 근거로서의 세상에 연민하는’ 노력으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반야는 그 행복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반야경을 들자면, 크게 다음의 일곱 부류로 나뉘어진다.
①소품계(도행반야경, 소품반야경, 팔천송반야경 등) ②대품계(방광반야경, 광찬반야경, 대품반야경, 이만오천송반야경) ③십만송반야 ④금강반야경 ⑤이취경, 백오십반야경 ⑥ 대반야경 ⑦ 반야심경.
여기에서 성립과정과 공통된 사상을 살펴본다면, 반야경전은 스스로가 인도의 남부지방에서 기원했음을 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팔천송반야바라밀경 등의 소품계열에 속하는 경전군이 가장 일찍 성립되었으며, 특히 도행반야경의 초두부분은 그 성립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야경은 공관에 의해 이루어내는 ‘지혜의 완성’을 설하는 경전이다. 여기에서의 공관이란 그 이전의 주요한 부파중의 하나였던 설일체유부의 실체적사고(實體的思考)를 비판 ․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수행자로서 보살(보살마하살)이 등장하는데, 이는 최초기불교에서부터 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 수행의 주체로서 역할해 오던 출가교단을 대신해 일반의 사람들이 수행이 주체가 되는 혁신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혁신의 주체들, 곧 보살들은 그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적 자유의 기치를 내걸게 되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공관이다.
3. 반야사상의 의의
반야심경에서 보자면, 나를 구성하는 심신에서부터 세간의 일체법 내지는 연기법 등 최상의 의지처라 해야 할 것들 조차 부정당하고 만다. 왜냐하면, 세간에서의 유정들의 의식은 모든 현상에 대하여 탐 ․ 진 ․ 치라는 독소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석존에 의해 설해진 최초의 가르침(초전법륜)을 비롯해 일체의 가르침은 그 교설의 목적이 탐 ․ 진 ․ 치의 지멸에 있으며, 나아가 반야경 역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곧, 공이 되었건 연기가 되었건, 하다 못해 사제의 가르침이 되었건 탐 ․ 진 ․ 치라는 독소를 없애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고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탐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 팔천송반야경이나 대반야경 등 반야심경의 형태로 그 내용들이 압축되기 이전의 경전들을 통해 본다면, 반야경이 설해진 연유가 오로지 공도리를 깨닫기 위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반야경 역시 여느 경전과 마찬가지로 실존의 고에 짓눌린 유정들에게 생존의 희망을 주고자 하고 있으며, 그 희망을 주는 분으로서 붓다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여 가르침이 전개되고 있음을 눈치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만오천송 반야의 주석서인《대지도론》이 그 이야기의 서두를 붓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信]에서 시작하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동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